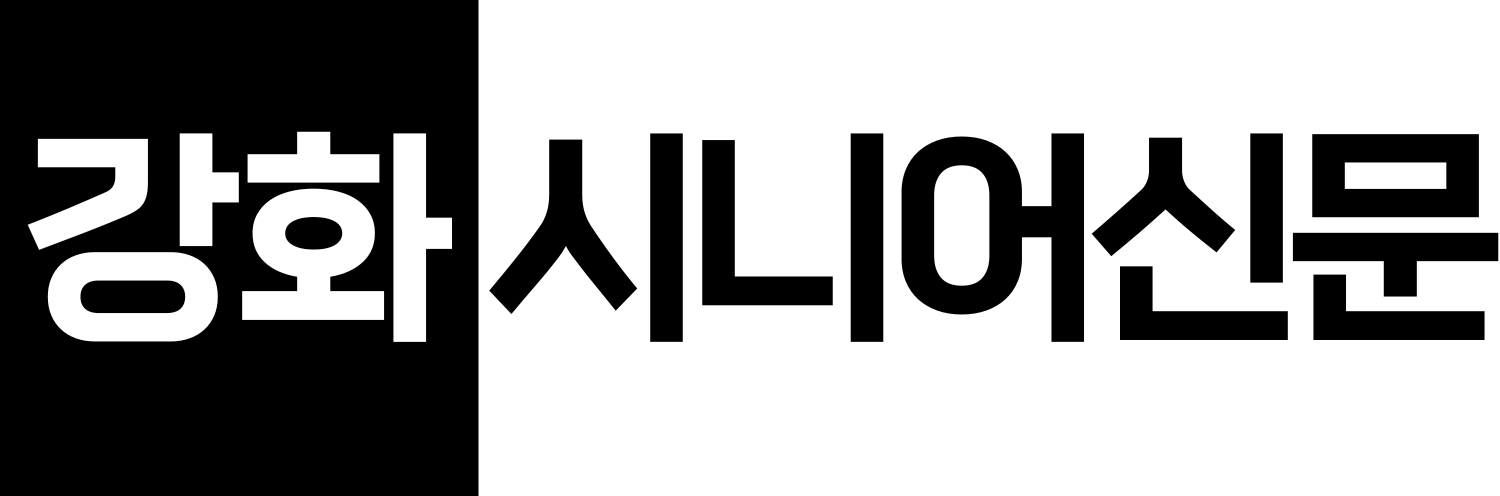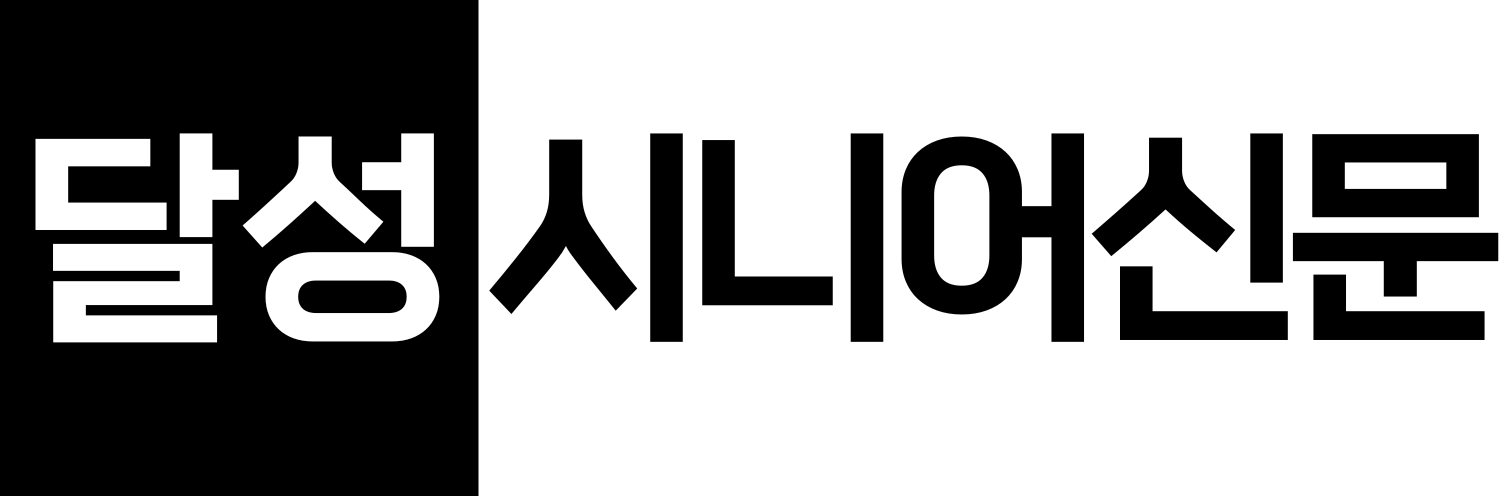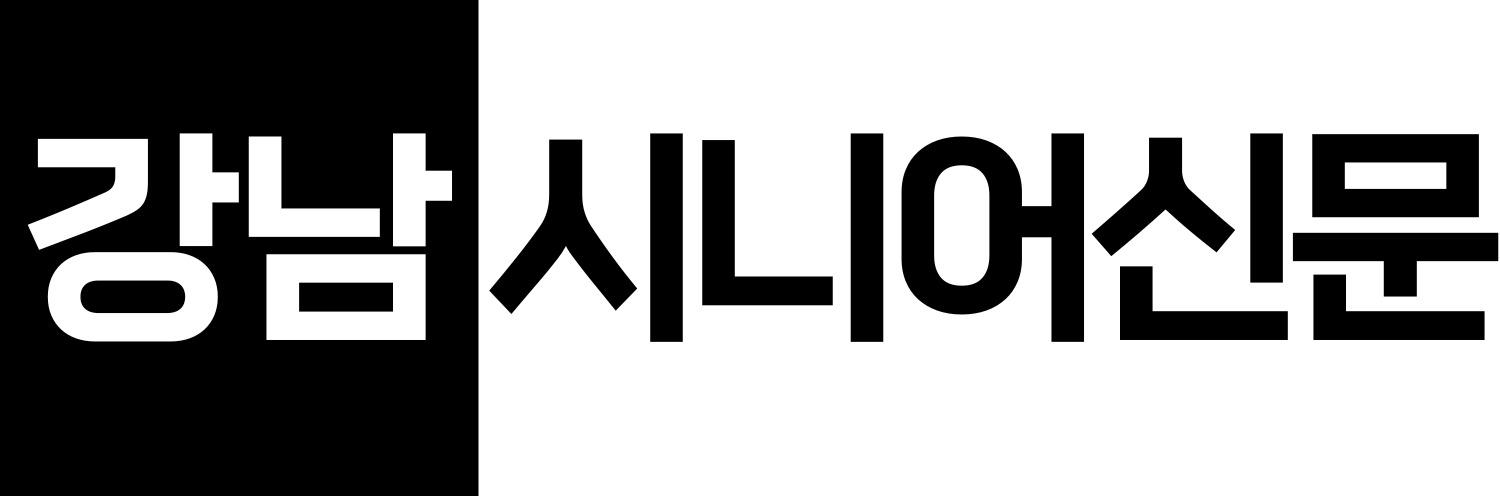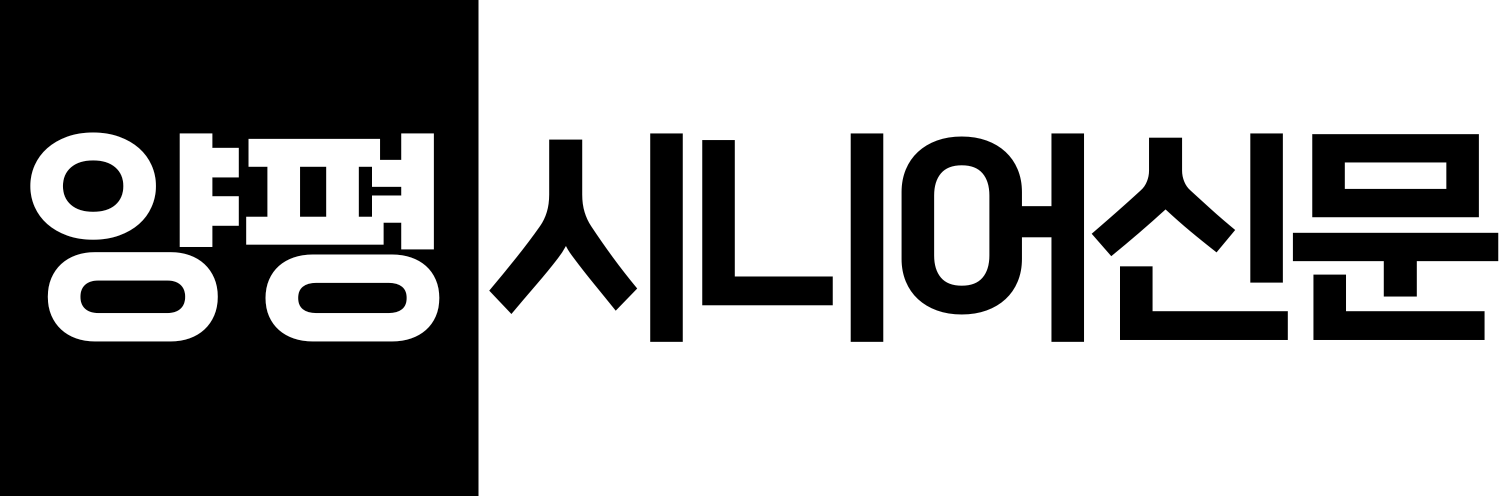날은 더운데, 요즘거리에선 1960~70년대 여름에 듣기만 해도 시원한 ‘아이스 깨~끼~이~!’ 소리가 왜 없을까? 온 국민이 살기 힘들다지만, 아이스깨끼 장사하지 않아도 밥 먹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설탕이 귀한 때, 아이스깨끼는 사카린과 식용색소를 넣고 20cm 전후 얼음 통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얼린 얼음과자다. 더 고급인 아이스캔디는 푹 삶아 분쇄한 팥에 일정비율의 물과 설탕을 넣어 얼린 얼음과자다.
양복이 일이 없는 여름이라 양복쟁이 시다발이에서 해고당한 순돌이는 아점을 먹고 충혼탑에 갔다. ‘아이스 깨~끼~~이~!’ 내뱉는 소리 따라가다가 깜짝 놀랐다. 한때 의성읍내 양복쟁이 시다발이 도반이었던 ‘박오복’이였기 때문이다. ‘오복아 내 화장실이 급해서인데…,’ 간혹 오복이가 내뱉는 ‘아이스 께~끼~~이~!’는 모든 이들 귀를 잡아끌었다. 박오복은 외할아버지 아들로 호적에 올라 있다. 호적상으론 외삼촌은 형님, 어매는 누님으로 되어있다. 이유는 오복이 어매가 사별한 남편을 숨기고 처녀시집을 가느라 창작한 웃지 못할 작품이다.
박오복이가 웃지 못 할 창작 작품을 알았는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안동으로 오익(가출)나와 중국집 뽀이로 취업했다고 한다. 여름에는 중국집뽀이보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아이스깨끼장사란다. 돈이란 말에 귀가 확 열린 실업자 순돌이는 ‘오복아 나도 아이스깨끼 장사, 어떻게 할 수 없을까?’로 물었다.
“순돌이시야도 할라카맨, 아이스깨끼공장에 통 값 800원을 맽기면 아이스깨끼는 외상으로 준다. 아이스깨끼 외상은 그날 공장에 통을 반납할 때, 아이스깨끼 판돈으로 갚으면 된다. 언제라도 장사하기 싫으면, 공장장님한테 그만두겠다고 카면, 아이스깨끼 통 값 800원은 돌려받는다.”
“하루 얼매 버는데”
“5원에 띠서 10원에 파니 5원이 남았다. 하루 100개 팔면, 500원까지 버는 장사다. 대신 반품이 없다. 그래도 장사해 볼래, 시야”
1971년 당시 라면 20원, 짜장면 60원하던 때, 500원이면 대단한 벌이었다. 오복이는 순돌이를 데리고 아이스깨끼공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사람이 있으면 ‘아이스 께~끼~~이~!’ 소리를 내질러 심심찮게 팔았다. 아이스깨끼공장은 순돌이가 근무하던 동방라사 바로 옆집이었다. 동방라사 사장님이 알면, ‘마, 순돌이가 아이스깨끼 장사하더라’ 할텐 데, 그것이 무슨 문제야. 우선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스깨끼공장에 도착해 공장장님을 만났다.
“너 몇 살이야” “15살이시더,” 순돌이 나이 17살에 비해 키가 너무 작았다. 혹시나 퇴자라도, 키울 수는 없는 키보다, 줄이기 쉬운 나이 두 살 줄였다.
“어디 사는데?” “야 하고 같은 성징골에 사니 더.” “자, 50개짜리인데 많이 팔아야한다.”
작은 덩치, 마순돌이는 무거운 아이스깨끼 통을 메고 땀을 흥건히 쏟으며 ‘아이스 깨~끼~~이~!’를 내 질러야 했으나, 아이스깨끼가 입술에 걸려서 나오지를 않았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소 앞길을 가면서 눈을 딱 감고 입술에 걸린 ‘아이스 깨~끼~~이~!’ 목이 찢어지라 토했다. 그 소리에 누가 아이스깨끼하나 달라고 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원림국민학교 동창 ‘박창식’이었다. 너무 뜻밖이라, ‘여름에 양복일도 없고 심심해서 오늘 처음 해본다.’는 순돌이의 서툰 변명은 듣지도 않고 돈을 주고 가버렸다.
아무리 입에 풀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상한 마순돌이는 일단 그 자리를 떴다. 군청 뒷길 가로수그늘 밑에서 고무신을 깔고 앉아 넋을 놓고 있다가 아이스깨끼를 달라면 팔았다. 저녁때가 되어 아이스깨끼 통을 열어보았다. 반 정도 남은 아이스깨끼는 저녁을 먹고 팔자. 안동에서 제일 가난뱅이들이 사는 성징골 자취방에 가서 저녁을 해 먹었다. 피로가 온 몸에 달려들어 잠시 피해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시인지, 일어나 아이스깨끼 통을 멨다. 가로등 없는 성징골 어둠을 벗어나, 읍내 가로등 밑에서 아이스깨끼 통을 열었다. 누구한테도 팔 수 없게 반 이상 녹아버린 아이스깨끼이었다. 아이스깨끼 녹은 물에서 건지니 22개나 되었다. 먹고 싶어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침만 삼키던 아이스깨끼를 건져 몸을 덜덜 떨며 얼음 똥이 나올 때까지 먹었다. 주변을 휘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먹다 남은 아이스깨끼는 하수도에 쏟아버렸다.
아이스깨끼 값 250원을 입금시킨 시간은 밤 11시었다. 아이스깨끼를 반 넘게 버리고도 30원을 벌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스깨끼를 많이 먹은 탓인지 배가 아프면서 급똥에 폭풍설사,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다. 아이스깨끼 폭풍설사후부터 지금껏 여름이 다 지나도 얼음과자 하나 먹지 않는다. 아이스깨끼장사를 하루 쉬고 정신을 차려 다시 나갔다. ‘아이스 깨~끼~~이~!’ 내 지르는 큰소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많이 판다.
안동읍내 제일 번화가인 조흥은행 앞거리에도 어둠을 다 쫓지 못하는 희미한 가로등, 순돌이는 ‘아이스 깨~끼~~이~!’를 큰소리로 내질렸다. 아이스깨끼를 파는 각자마다 내지르는 ‘아이스 깨~끼~~이~!’ 소리는 봄철 짝을 찾는 개구리합창소리처럼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아이스 깨~끼~~이~!’ 소리 내지를 틈새를 잃은 순돌이는 큰소리치는 아이 뒤만 따라 다니며 팔았다.
갑자기 순돌이 머리에 번갯불, ‘아이스 깨~끼~~이~!’ 큰소리 뒤에 ‘나~도~^요~~~’하면서 뒤따랐다. 사람들은 아이스깨끼 뒤에 ‘나~도~^요~~~’, 그 말이 고단한 삶에 카타르시스였는지, 앞에 아이스깨끼 소리 내지르는 친구보다 더 많이 팔아주어 밤 8시경에 다 팔았다. 다시 한통 받아, 제일 목소리 큰 친구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도~^요~~~’ 하면서 팔아 밤 11시 경에 공장에 갔다. 오늘은 아이깨끼 100개 중, 85개 팔아 425원을 벌었다.
양복쟁이 시다발이 반달월급을 하루에 벌었다는 기쁨에 어제 아이스깨끼 폭풍설사에도 지칠 줄 몰랐다. 돈 버는 즐거움에서 벗어나자 갑자기 허기가 몰려오면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등에 붙은 배를 껴안고 자취방에 가서 아침에 먹다 남은 쉰밥을 찬물에 씻어서 허겁지겁 먹자 말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음 날 12시 경에 살았다. 세수하고 아이스깨끼 장사갈라고 일어나려는데 짚은 팔에 어깨통증을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 다시 쓸어졌다.
엊그제 아이스깨끼 폭풍설사에 11시간 넘게 무거운 아이스깨끼 통을 맨 어깨가 퉁퉁 부어올라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선풍기도 없던 그 여름, 어깨통증에 부채질도 못했던 찜통여름 추억은 아득히 먼 옛이야기다. 아무리 찜통더위에도 ‘덥다’ 말로 더위를 절대로 불러들이지 않은 순돌이는, ‘나~도~^요~~~’ 때문일까? ‘아이스 깨~끼~~이~!’ 트라우마(Trauma) 때문일까. 아니면 아이스깨끼 폭풍설사 때문일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수깨끼.